40년 가까이 ‘비정규직’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흥미 트리거를 찾아 유랑하는 인물이 있다. 일본의 유명 잡지 <POPEYE>와 <BRUTUS>가 창간한 해부터 10년간 에디터 생활을 했던 츠즈키 쿄이치다. “그저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있으면 먼저 취재를 시작한다.”라는 슬로건 하나를 내걸고 커리어를 이어온 그는 벌써 68세 저널리스트다.
한 잡지사나 출판사에 머물며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조명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떠돌다 재밌는 이야깃 거리가 나타나면 카메라를 꺼내드는 것이 그의 방식. 대학교 시절 구입처를 물어보기 위해 <POPEYE> 매거진에 엽서를 썼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40년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단순한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기사 번역, 원고 작성 그리고 취재까지 이어서 하게 되었다고. 그는 <POPEYE> 편집부 생활을 회상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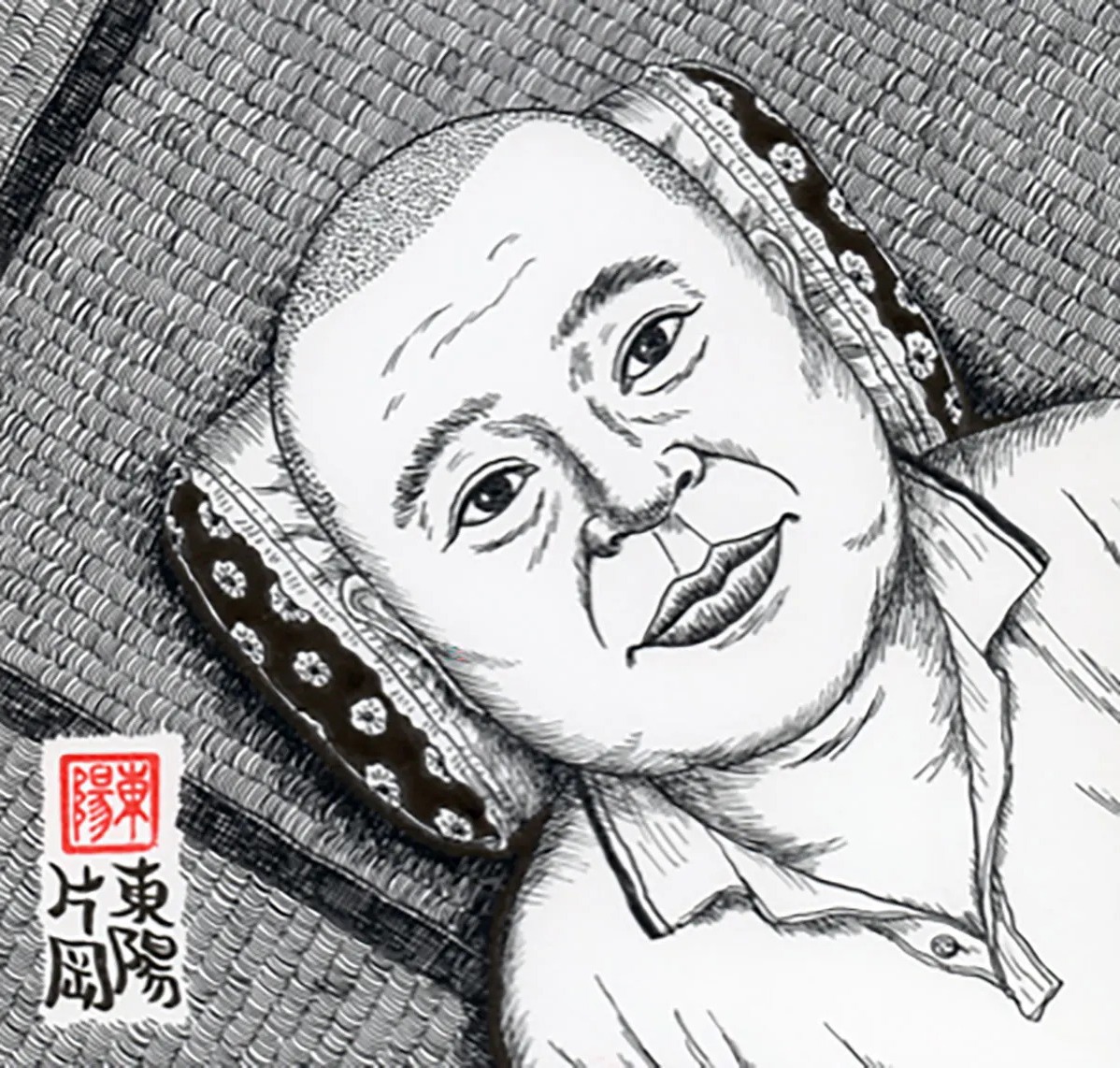
나는 기획하는 방법이나 소재를 찾는 법을 배운 기억이 없다.
상사가 내게 해준 말이라고는 ‘밖에 나가서 찾아와’가 전부였다.
그는 상사에게 배운 것은 딱 하나, 즐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책상 앞에 앉아 어떤 기획의 기사가 재밌을지 구상하는 것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장을 발로 뛰며 직접 ‘소재’를 대면해야만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고. 그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취재 방식이다.



# 모두가 소수라 일컫는 것들이 사실은 다수다
1993년 그는 교토쇼인 출판사와 함께 <TOKYO STYLE>을 출간했다. 당시에는 ‘OO Style’이라는 이름의 고급 인테리어 잡지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었다. 시리즈가 흥행하자 저자인 뉴욕의 유명 저널리스트 수잔 슬레신이 ‘Japanese Style’ 편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 알음알음 츠즈키 쿄이치를 알게 된 그녀는 그에게 촬영할 만한 집을 구해줄 것을 의뢰했다.
고급지고 세련된 집을 찾는 데 애를 먹던 츠즈키 쿄이치. 그는 ‘왜 이렇게 화보에 나올 법한 멋진 집은 찾기가 힘든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세련된 집을 가진 일본인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흘러갔다. ‘Style’은 ‘양식’이라는 뜻이다. 무언가가 많아지면 ‘양식’이 되지만, 무언가가 조금밖에 없다면 그건 ‘예외’에 불과하다.




당시에는 도쿄 사람들의 주거 양식을 비웃는 단어로 ‘토끼장’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는 토끼장처럼 좁은 집에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로, 높은 물가와 인구 밀도 탓에 많은 청년들이 택한 주거 양식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Japanese Style’, ‘Tokyo Style’이었다. 츠즈키 쿄이치는 이러한 도쿄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담아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살고 싶은 집을 취재해도 모자랄 판에 ‘토끼장’같은 집들을 적나라하게 촬영하는 기획이라니, 출판사가 받아줄 리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진 촬영을 할 줄 몰랐다. 하지만 출판사의 단호한 거절에도 미련이 생겼던 그. 결국 요도바시 전자상가로 뛰쳐나가 대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TOKYO STYLE>의 사진에 공간의 주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도 카메라에 미숙한 것이 원인이었다. 좁은 공간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숫자를 세 가며 촬영했던 그. ‘사람을 1분 동안 가만히 세워놓을 수 없으니 공간의 주인은 함께 찍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를 사진작가라고 칭하지만, 츠즈키 쿄이치 본인은 ‘편집자’라고 소개한다. 이는 사진의 미학적 가치가 그의 최우선 가치가 아니기 때문일 것. 그는 사진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정보와 사실에 집중했다.



# 아무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합니다
그는 흔하게 존재하지만 저속하거나 교양 없다는 이유로 대중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주제들을 모아 <STREET DESIGN File>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다. 러브호텔, 독일 정원에 두는 난쟁이 엘프 조형물, 프로 레슬러의 마스크 등이 주제였다. 또, ‘잘 부탁해 현대시’를 연재하며 전통 문학 대신 사형수의 하이쿠와 같은 현대시를 소개했다.
지금도 많은 대중매체는 다수가 소수를 올려다보는 구조를 지향하고, 조장한다. 지방인들은 도시 생활을 선망하고, 평범한 벌이의 직장인들은 1% 부자의 삶을 꿈꾼다. 츠즈키 쿄이치는 자신의 글과 사진으로 이러한 구조에 반기를 들었다. 평론가가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직업이라면, 그가 생각하는 저널리스트란 ‘이런 선택도 있다’라고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특한 기획을 선보이며 그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다뤘다면 본인 역시 독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의 수혜자다.







# Happy Victims
츠즈키 쿄이치를 논하며 <Happy Victims>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가 일본,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을 돌며 전시까지 했던 이 시리즈는 한 가지 브랜드에 중독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겨우 몸을 누일 만한 좁은 집에 살면서 수백만 원짜리 디자이너 브랜드 아이템들을 모으는 마니아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행복한 피해자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럭셔리 브랜드로 치장한 사람의 적나라한 라이프스타일을 관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Happy Victim>는 그가 약 10년간 연재했던 기사를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 옷치장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의 글들이 남 얘기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독자라면 현재 그가 운영하는 뉴스레터 <ROADSIDERS’ Weekly>를 들여다보자. 필자 역시 일어를 읽을 줄 몰라 얼렁뚱땅 번역기로 대충 이해하고는 있지만.
